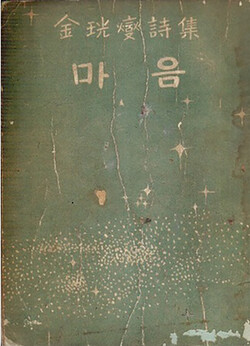
[현대해양] 김광섭 시인은 1905년 9월 22일 함경북도 경성군 어랑면 송신동에서 김인준(金寅濬)의 아들로 태어났다. 경성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하여 경기도 경성부 운니동(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에 거주하였으며,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다가 중퇴하고 중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와세다대학 영문과에 진학하여 1932년 3월 졸업했다. 같은 대학 불어불문학과에 적을 둔 이헌구(李軒求)와 친교를 맺었으며, 이어 정인섭(鄭寅燮)과 알게 되어 해외문학연구회에 가담하였다.
귀국 후 1933년 4월 모교인 중동고등보통학교의 영어교사로 채용되었다. 교사 재직 중에 꾸준히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했는데 민족차별정책에 대해 자각하도록 동기를 심어주었다. 그는 1942년 5월 31일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그해 11월 30일부터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44년 11월 30일 만기출옥한 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광복을 맞았다. 광복 후 미군정청 공보국장으로 근무했으며, 1947년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결성되자 창립총회에서 출판부장에 선출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직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첫 공보비서관을 지냈다. 1951년 사퇴 후 대전에서 대전신문 사장을 역임했고, 1958년 10월에는 세계일보 발행인에 취임하였다. 이후에는 주로 경희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자유문학가협회를 만들어 위원장직을 맡고, 『자유문학(自由文學)』지를 발행했다.
그의 문학활동은 1927년에는 와세다대학의 우리나라 학생 동창회지인 『R』에 시 「모기장」을 발표함으로 시작되었다. 1933년 『삼천리(三千里)』에 「현대영길리시단(現代英吉利詩壇)」을 번역, 발표했고, 같은 해 시 「개 있는 풍경」을 『신동아』에, 평론 「문단 빈곤과 문인의 생활」을 『동아일보』(1933.10.2.)에 발표했다. 이어서 1934년 『문학(文學)』에 「수필문학고(隨筆文學考)」, 『조선문학(朝鮮文學)』에 「현대영문학에의 조선적 관심(朝鮮的關心)」을 발표하는 등 여러 장르에 걸쳐 활발한 문학활동을 전개했다. 본격적으로 시작(詩作)에 들어선 것은 1935년 『시원(詩苑)』에 「고독(孤獨)」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 시는 일본에 의해 주권을 상실한 좌절과 절망을 읊은 것이었다. 1937년 극예술연구회에 참가, 연극운동에 가담하면서 서항석(徐恒錫)·함대훈(咸大勳)·모윤숙(毛允淑)·노천명(盧天命) 등과 교유했다.
1938년 제1시집 『동경(憧憬)』을 간행했고, 광복 후에는 민족주의 문학을 건설하기 위해 창작과 단체활동을 병행했다. 이 무렵의 시로는 「속박과 해방」·「민족의 제전」 등이 있는데, 광복의 환희와 민족의식을 표현한 것이었다. 1949년에 간행된 제2시집 『마음』과 1957년에 간행된 제3시집 『해바라기』의 시는 민족의식과 조국애가 더욱 확대되고 심화된 시편들이었다.
후기의 작품들은 1966년에 간행된 시집 『성북동 비둘기』와 1971년 간행된 『반응(反應)』에 수록되었는데 전자에서는 병상에서 터득한 인생·자연·문명에 대한 통찰과 아울러 1960년대의 시대적 비리도 비판하였고, 후자는 사회성을 띤 시들로서 1970년대 산업사회의 모순 등을 드러내고 있다. 김광섭 시인은 해방 이후에 펴낸 제2 시집인 『마음』에 일제 강점기에 쓴 몇 편의 바다시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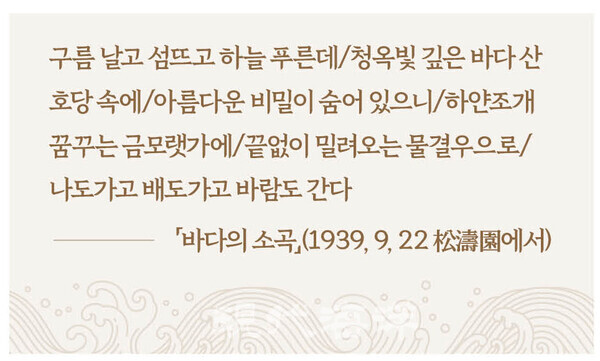
「바다의 소곡」은 그 유명한 조선 최고의 해수욕장인 송도원에서 씌어진 시임을 밝혀놓고 있다. 이곳은 분단 이전엔 조선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외국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곳이었다. 아름다운 백사장과 시설이 갖추어진 국내에서는 유일한 국제적 피서지였다. 이곳에서 시인은 그 아름다운 바다의 <끝없이 밀려오는 물결우>에 자신을 모두 맡기는 형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물결 따라 <나도가고 배도가고 바람도 간다>고 노래한다. 일제 강점기의 옥죄는 삶 속에서 자신을 바다에 자유롭게 풀어놓고 있는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 그 바다에서 「수영」을 통해 자유를 경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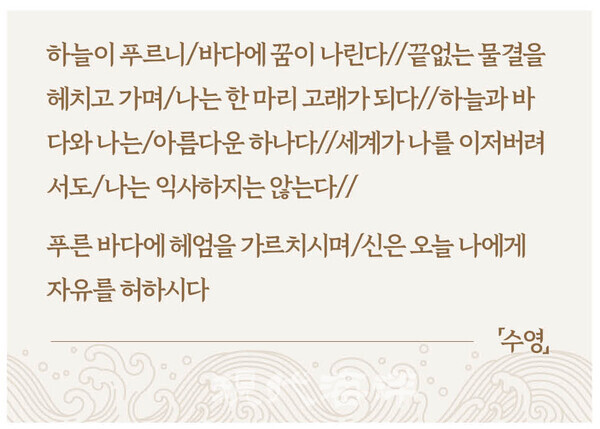
바다는 인간을 감싸고 있는 자연의 대표격이다. 그러나 그 바다를 인간이 마음껏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다. 시인은 그 바다를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꿈을 펼친다. 그 꿈이 <끝없는 물결을 헤치고 가>는 고래가 되는 것이다. 고래가 되면 세계가 나를 잊어버려도 <나는 익사하지는 않는다>고 노래한다. 푸른 바다를 향해 헤엄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시인은 하늘이 자신에게 허한 자유라고 인식한다. 구속과 속박이 일상화된 당시의 현실을 벗어나 열린 바다를 통해 자유를 갈구하고 있는 시인의 꿈을 엿보게 된다. 이러한 한 맺힌 꿈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있음을 다음 시에서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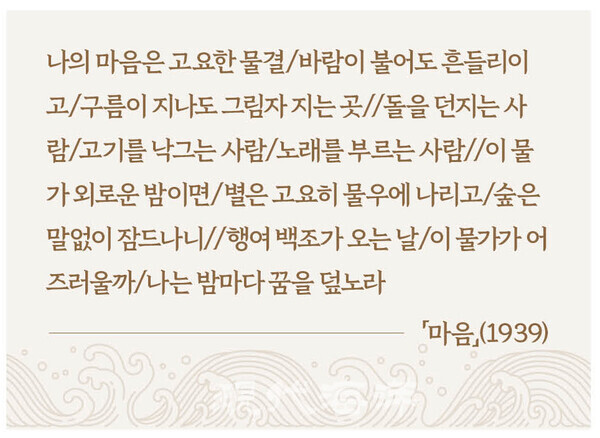
이 시에서 시인은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이라고 노래함으로써 마음이 바다가 되고 있음을 이미지화하고 있다. 그리고 시인은 밤마다 <행여 백조가 오는 날/이 물가가 어즈러울까> 꿈을 덮고 있다. 꿈을 덮는 행위는 꿈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다. 마음 속 깊이 자유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일제강점기 치욕의 역사 속에서 시인이 겪었던 옥고의 경험은 인간의 삶에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김광섭 시인에게도 바다는 역시 열린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web-resources/image/8.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