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출간된 김기림의 시집 [바다와 나비] (출처 신문화연구소)](https://cdn.hdhy.co.kr/news/photo/202507/32315_33063_70.jpg)
[현대해양] 김기림은 1908년 함경북도 성진군 학중면 임명동의 양반 가정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지주 김병연(金丙淵)의 1남 6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21년 서울 보성고보에 입학하였다가 중퇴하고 일본 도쿄 메이쿄 중학, 니혼대학 문학예술과를 거쳐 1929년 조선일보의 기자로 활동하였다. 1936년 도호쿠 제국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여 1939년에 졸업하였다.
김기림은 종래 1920년대 대한민국 시단을 지배하고 있던 내용 편향의 문학과 감상주의 문학의 지양을 외치며, 카프로 대변되는 계급문학과 백조파로 대변되는 감상적 낭만주의 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시 정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림이 주장한 새로운 시는 건강하고 명랑한 ‘오전의 시’이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대적 감성을 담은 과학적 방법으로 쓰여진 시이다.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시는 기차, 비행기, 화물차 등의 근대적 사물을 다루면서 도시적 감각과 정서를 담은 근대성을 주된 정서로 다룬다. 방법론적으로는 종래의 리듬 중시의 노래하는 시에서 벗어나 이미지와 의미, 음성 자질을 치밀하게 짜맞춘 과학적인 시이다. 문학사조론으로 볼 때는 차가운 이성을 강조하는 주지주의와 회화성을 강조하는 이미지즘의 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김기림은 이태준, 정지용 등의 모더니스트들과 함께 구인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으며, 시론, 평론 외에 시 창작도 활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론가로서의 명성에 비해 시의 문학적 성취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방 이후에는 모더니스트에서 일변하여 좌익 계열의 조선문학가동맹에 합류해 적극적인 현실 참여의 시를 쓰게 된다. 김기림뿐만 아니라 이태준, 정지용, 박태원 등 1930년대 모더니스트들의 상당수가 좌익 계열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이미 조선공산당 불법화 및 카프 해산 등으로 이념성의 문학이 사실상 금지되었던 시기였으므로 사상과 관계없이 내면의 문학으로 침잠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1948년 이후 조선문학가동맹이 미군정의 탄압으로 와해되면서 상당수의 인사들이 월북하는 가운데, 김기림은 결혼해서 자식과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처지라 서울에 남아 대학 강단에서 시론을 강의하면서 후학 양성에 몰두해야 했다.
그런데 김기림은 6.25 전쟁 발발 후 납북되었다. 이는 수필가 조경희가 부산에서 만난 김기림의 누나에게 알려준 소식이었다. 소식을 들은 김기림의 누나는 조경희를 붙들고 거리에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 조경희에 의하면 한강인도교 폭파로 인해서 피난을 가지 못한 김기림이 서울 사범대에서 회의를 마치고 을지로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지프차를 탄 2명의 남자(혹은 한 명의 청년)가 찾아와서는 그를 서대문형무소로 끌고갔다고 한다. 이후 북한으로 납북되었다는 것.
납북자들의 대부분이 이후에라도 생사나 북한에서의 행적이 일부라도 확인되는 반면에 김기림은 아직까지도 생사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선 수감되어 있다가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북으로 끌려가던 중 사망한 이유로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가 납북된 게 아니라 월북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지만, 남은 기록들과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김기림이 자의로 월북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우선 김기림의 정치성향이 좌파적이긴 했으나 박헌영류의 남로당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여운형의 좌우합작 노선 계열을 지지했다는 점이 꼽힌다. 이는 남로당과 조선문학가동맹이 불법화와 탄압으로 와해되면서 임화나 김남천은 월북했지만, 김기림은 월북하지 않고 남한에 남아 대학들에서 강의를 한 김기림의 행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월북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남아 있었단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자진 월북이라면 가족들을 안 데려갈 이유가 없을 텐데 가족들은 남겨두고 혼자갔다는 점, 북한에서의 행적은 물론 생사도 확인되지 않으며, 다른 월북문인들과는 달리 대접을 받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의 월북이 아닐 것이라는 근거로 제시된다.
현재로선 김기림이 북으로 끌려가던 중 정지용과 마찬가지로 폭격으로 사망한 탓에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란 게 가장 유력한 설로 보인다. 김기림의 시 「바다와 나비」를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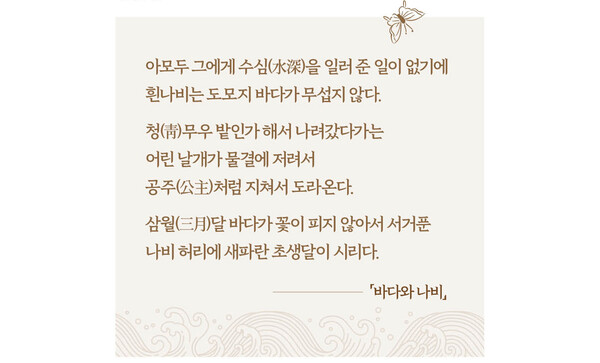
「바다와 나비」는 1939년 『여성』지에 실렸던 시이다. 사나운 바다에 나비를 대비시켜 식민지 현실과 시적 자아와의 서로 대립되는 상황과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바다의 심상에서 들(청무우 밭)과 나비를 유추한 김기림의 상상력은 종래의 시와 달리 시의 현실적 기능을 중시한 영국 시인 스펜더(Stephen Spender)의 「바다 풍경」과의 영향을 논의하기도 한다.
한편 문학사적으로 이 시는 식민지 근대 문인들의 정신사적 모습의 하나인 ‘현해탄 콤플렉스’가 작동한 시로 해석하기도 하고, 도일 유학 후 생활 감각이 드러난 시로, 일제 식민체제화의 지식인의 의식 등으로 해석되어 왔다.
일본의 문인이었던 안자이 후유에(安西冬衛 1898~1965)의 단시(短詩) 「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도 한다. 본래 안자이 후유에의 「봄」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나비 한 마리가 달단해협(타타르 해협)을 건너 갔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인데, 「봄」의 나비는 날개도 작고 가냘프지만 장하게도 바다를 건너 대륙으로 가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 나오는 나비는 그렇지 않다. 바다가 도무지 무섭지 않아 청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가지만, 거대한 바다의 물결에 젖어 지쳐 돌아오게 된다.
1930년대 지식인들 중에는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새로운 근대문명을 과도하게 선망하여 현해탄을 건너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결국 식민지 지식인의 한계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일제말 강점기 시대에 무작정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섰던 지식인들은 근대문명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압도되어 좌절하거나 절망했던 것이다. 그 상황이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