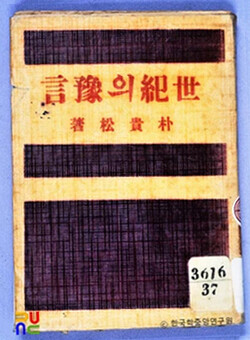
[현대해양] 박귀송(朴貴松)의 『애송시집』은 그의 처녀시집이다. 이 시집은 130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귀송 시인이 1934년에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자비로 출간하였다. 총 98편의 시를 8부로 나누어 수록하였고, ‘시집(詩集)을 내놓으면서’라는 자서(自序)와 말미에 ‘저자(著者)로부터’라는 후기가 붙어 있다. 자서에서 시인은 자신의 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다.
“여기에 모인 시편 전부가 나의 고독하던 소년 시대를 대표하고, 우수(憂愁)한 스무 살 때를 그린 것이다. 불행히 다감(多感)으로 생겨나서, 설음으로 지낸 나의 소년 時의 연약한 발자국이다. 밟을 내야 두 번 밟지 못할 나의 소년시에 꺾어 두었던 수많은 꽃포기다. 이제 걸음걸이 곧지 못한 스물의 발자국을 돌아보고 쉴새없이 꺾어 두었던 귀여운 꽃포기를 정성으로 모아서 이 『애송시집』을 만들었다. 이 시집 속의 어느 것이 세상에 많은 젊은 사람들의 서러운 마음을, 얼마만치라도 위로(慰勞) 식힌다면 나에게는 그 이상의 기쁨이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약관의 나이에 펴낸 이 시집은 설움으로 지낸 소년 시절의 ‘연약한 발자국’이라고 작자도 표현하였듯이 시인의 나이 20세 전에 쓰인 것들로서 전체적으로 감상적인 색조를 띠고 있다. 또한, 작품들은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여 상징시·자연시·인생시 등의 여러 경향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 시인의 변(辨)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소년기의 감상과 낭만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 시집에는 애수(哀愁)와 절망이라는 초기 시편들의 특색이 잘 나타나 있는데, 후기 작품들 중에는 고요하고, 평온하고, 밝고 새로운 희망의 추구를 보여주는 시편들이 눈에 많이 띈다.
이 시집의 대체적인 특색은 소박한 시상과 솔직한 표현으로, 대부분이 순정소곡(殉情小曲)이고 사랑을 주제로 한 애상(哀傷)의 시이다. 그러나 대상을 선택하여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직서적(直敍的)인 표현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시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래도 이 시집 속에서 바닷가 모래에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슬픈 사연을 노래하고 있는 몇 편의 시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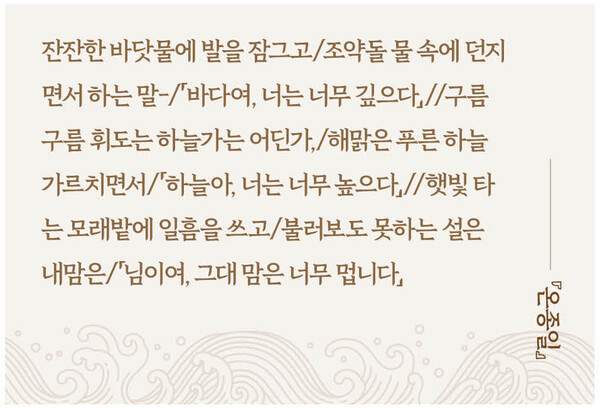
시적 화자는 온종일 바닷가 모래밭에 앉아 누군가의 이름을 쓰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 이름에 맺힌 아픔이 너무도 크기에 시에서는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다고 토로한다. 불러서 대답을 듣고 싶은 두 곳을 이 시에서는 노래하고 있다. 하나가 바다이고 또 다른 한 곳이 하늘이다.
그런데 그가 있을 법한 바다는 너무 깊고, 하늘은 너무 높아서 그의 외침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 아파한다. 깊은 바다나 높은 하늘보다 더 먼 곳에 존재하는 그대이기에 <님이여, 그대 맘은 너무 멉니다>라고 읊조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님을 향한 그리움의 감정은 「믿지 못할 생각」에서도 여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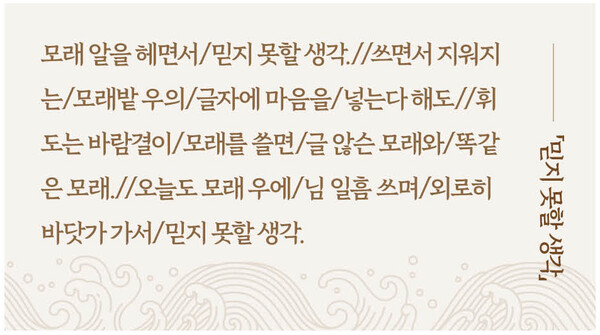
잊을 수 없는 님의 이름을 모래 위에 써보지만, <휘도는 바람결이/모래를 쓸면> 그 이름자는 다시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쓰면서 지워지는/모래밭 우의/글자에 마음을 넣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오늘도 모래 우에/님 일흠 쓰며>라는 언표는 이를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러한 생각과 행위를 시적 화자는 <믿지 못할 생각>이라 명명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님에 대한 생각에 모든 것을 쏟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음이다. 이런 행위는 「바닷가에서」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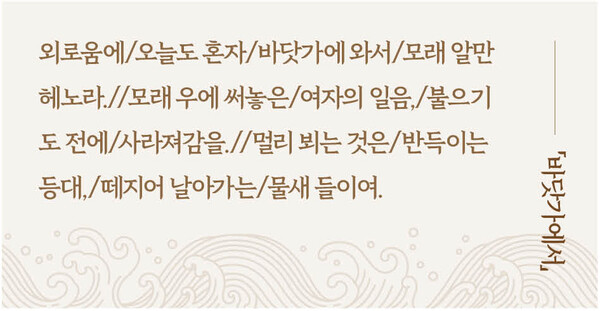
바닷가 모래사장에 시적 화자를 떠난 여자의 이름을 써보지만, 그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사라져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별의 슬픔이 더욱 짙게 드러난다. 그 애달픔을 <멀리 뵈는> <반득이는 등대>와 <떼지어 날아가는/물새 들>에게 그 감정을 의탁하고 있다. 「청진 해안에서」는 이런 생각의 행위가 단순히 이름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대를 그리는 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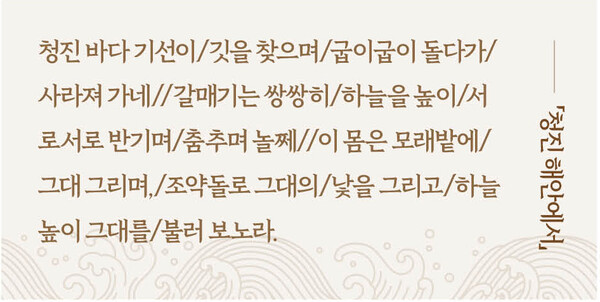
이 시에서는 님을 향한 그리움을 이름을 쓰는 선에서, 그대를 그리는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름을 쓰던 시적 화자는 이제 <조약돌로 그대의/낯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는 <하늘 높이 그대를/불러 보>고 있다. 그러면 과연 시적 화자가 그리고 있는 님은 어떤 자인가? 「소년의 詩筆」에서 어렴풋이 그 대상을 추리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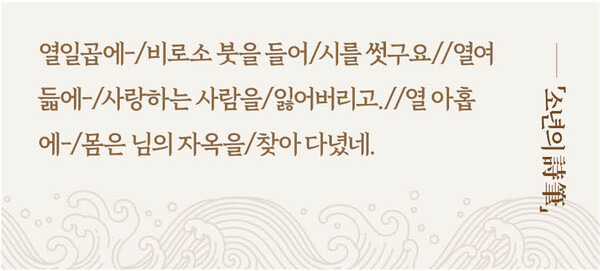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못내 잊지 못하고 그 이름을 쓰고, 그의 낯을 그리고 있는 주체가 열여덟 살에 잃어버린 사랑하던 사람임이 드러난다. 잃어버린 이후 계속해서 그 자취를 찾아다녔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므로 박귀송 시인에게 있어 바다는 잃어버린 그녀를 생각하며 그리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