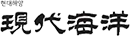[현대해양] 절기로 우수(雨水)가 지나고 온갖 생명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경칩(驚蟄)이 가까워지는 날, 을사년 봄맞이 전국 탐조대의 첫 방문지인 삼척 맹방 바닷가로 향했다. 봄비가 내려 기온은 쌀쌀했지만,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가 어울러진 맹방 해안의 빼어난 절경이 발걸음도 가볍게 했다.
맑고 탁 트인 동해를 바라보며 파란 바닷물에 답답한 가슴을 내려놓고,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를 귀에 담는다. 세찬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일상의 분주한 마음을 잠시 접어둔다. 마음속으로 ‘쉼-틈’과 ‘사이-새’를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맹방항에서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후진항, 오십천, 어달항을 지나 마침내 강릉 경포대에 도착했다. 길을 따라 방울새, 흰뺨검둥오리, 개똥지빠귀, 회색머리아비, 가마우지, 뿔논병아리 등 다양한 들새와 바닷새들을 만났지만, 이전 두 차례의 전국 탐조 경험과 기대에 비하면 새들의 종과 개체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든 듯했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 아쉬움이 스쳐 지나가지만, 여전히 새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반가움과 기쁨이 가슴 가득했다.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을 다시 느꼈다.
겨울 철새들이 떠나고, 텅 빈 듯 고요한 경포대 호수를 지나 남대천, 슾포 습지, 아야진 해변, 화진포, 그리고 대진항까지 탐조의 여정은 이어졌다. 바닷새를 찾아 걸으며 검은목논병아리, 큰회색머리아비, 귓뿔논병아리, 바다비오리, 호사북방오리, 흑기러기, 흰줄박이오리 등을 새 목록에 추가할 수 있었다.

기대했던 만큼의 새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그 아쉬움도 자연이 주는 경험이고 선물이라고 생각됐다.
우리 탐조대는 삼일절에, 철원, 한탄강에서 두루미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탐조 여정을 동해안에서 내륙지인 철원으로 이어간다. 철원 한탄강은 나의 탐조 경력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다. 올겨울에 벌써 세 번째 한탄강을 방문한다.
나에게는 한탄강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한탄강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그 찬란한 햇빛을 가르며 비상하는 두루미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는 것이다.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며 설렘을 안고 한탄강으로 향한다.
이전 두 차례, 매우 혹독한 추위 속의 섣달 그믐날 철원 한탄강 강가에서 밤을 새우고, 설날 아침 영하 26도의 기온 속에서 토교저수지 둑방에 올랐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카메라의 부품들이 꽁꽁 얼어서 작동을 멈추었고, 손가락이 카메라에 꽁꽁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았던 고통의 시간까지, 그 모든 것이 강열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설날 아침에 혹한 속에서도 두루미의 새해 첫 날갯짓을 담고자 했던 그 열정과 간절함이, 다시 한 번 삼일절에 나를 철원 한탄강으로 이끌고 있다.

해마다 약 5만 마리의 기러기와 8천여 마리의 두루미가 한탄강을 찾아온다. 그들이 밤을 보내는 토교저수지는 삵등 천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는 요새와 같은 곳이고 포근한 안식처가 된다.
차가운 겨울 밤에도 이곳에서 새들은 서로서로에게 몸을 의지하여 온기와 휴식을 취하고 새날이 밝으면 광활한 철원평야로 날아가 먹이를 찾는다. 토교저수지는 농부들에게는 농업용수를 위한 단순한 저수지이지만 한탄강을 찾아온 겨울 철새들에게는 생명 보존의 터전이자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다.
“토로로, 토로로”, “쾅쾅”, 갑자기 터져 나오는 폭음과 함께, 두루미와 기러기들이 일제히 하늘로 솟구쳤다. 수천 마리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는 그 장관 앞에서 나는 숨을 잠시 멈추었다. 그들은 우리 머리 위를 지나며 서로서로 아침 인사말을 끊임없이 주고받는다. 일출의 광채를 가르며 펼쳐지는 새들의 대화,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군무(群舞),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토교저수지, 밤새 잠들었던 기러기와 두루미를 만났던 체험은 잊을 수 없는 경이로운 장면으로 추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흰 눈을 머리에 인 먼데 산들이 중첩되어 어우러진 광경은 스스로 한 폭의 동양화가 된다. 두루미와 기러기가 우리들의 머리 위로 날아서 ‘또르르 뚜루룩’ 새날이 밝았다고 노래하며 먹이터로 나아간다.
다음 호로 이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