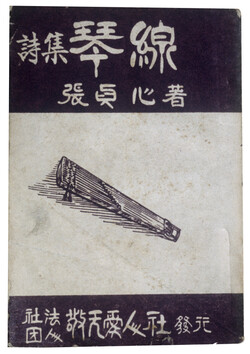
[현대해양] 장정심(1898-1947)은 1898년 개성에서 태어났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신교육을 받았다. 1925년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이화학당 유치사범에 진학했다. 졸업(제3회) 후에는 고향의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부설 유치원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생겨나기 시작한 여성운동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개성 감리교회 청년 조직인 엡윗청년회(Epworth League)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개성 여자교육회에서 강사와 임원으로 활동했고, 개성 신간회의 간사로도 활동했다. 장정심은 서울의 감리교 협성여자신학교에 다시 입학해 공부의 영역을 넓혔다.
그리고 1927년 『청년』에 시작품 「기도실」 등을 발표하면서 시인이 된 뒤 시집 『주의 승리』(한성도서주식회사, 1933)와 『금선』(한성도서주식회사, 1934)을 발간했다. 또한 여성 선교의 시각으로 『조선 기독교 50년 사화』(감리회신학교, 1934)를 편찬했다. 장정심은 1938년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의 서기를 거쳐 제4대 총무가 되어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일제의 경찰에 끌려가 협박을 받고 신사참배와 총후보국 강조 주간 행사에 참여할 것에 굴복했으나, 건강을 이유로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다. 역사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친일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장정심은 1947년 개성의 자택에서 병환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1933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간행한 『주(主)의 승리(勝利)』는 그의 첫 시집으로 신앙생활을 주제로 하여 쓴 단장(短章)으로 엮은 작품집이다. “내게 당신이 한마디도 안 했어도/오늘은 확실히 알았읍니다/말은 없어도 당신의 눈동자에/맑고 진실한 사랑을 알았읍이다(「맑은 그 눈」).”와 같이 그는 독실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맑고 고운 서정성의 종교시를 씀으로써 선구자적 소임을 다한 여류시인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1934년 경천애인사(敬天愛人社)에서 출간된 제 2시집 『금선(琴線)』은 서정시·시조·동시 등으로 구분하여 200수 가까운 많은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시집에는 시조로 「바다」, 「배머리」와 동시 「물고기」가 실려 있다. 먼저 시조인 「바다」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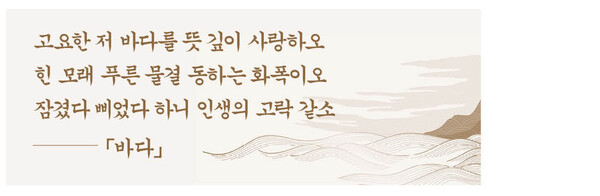
바다를 두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것도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뜻 깊이> 사랑한다고 노래한다. 뜻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다에 대한 생각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뜻이 깊다는 의미이다. 즉 바다를 통한 생각이 깊다는 말이다. 그 바다에 대한 생각이 우선 고요한 바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바다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고요한 바다가 아니다. 늘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파도가 치는 바다가 일상적인 바다의 모습이다. 그런데 시인은 우선 <고요한 저 바다>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시인이 지닌 영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장정심 시인은 신심이 깊은 기독교 신자로서 그의 많은 시들이 신앙을 토대로 하고 있다. 신심은 깊어질수록 세계를 인식하는 시선도 깊어진다. 단순히 표피적인 현상의 지각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계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사유의 뿌리에 늘 다가서 있게 된다. 바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파도로 거칠고 험난한 모습으로 감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바다의 표면을 넘어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바다는 고요한 상태로 유지된다. 이러한 바다의 내면세계에 장정심 시인의 시선이 가닿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세계로의 사유는 그가 지닌 신앙의 토대로 여겨진다. 종교심은 인간의 사유 중에서 가장 내면적이고 심층적인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바다의 내면으로만 향해 있지 않다. <힌 모래 푸른 물결 동하는 화폭이오>에서 보이듯 바다의 푸른 물결이 움직이면서 드러내는 장면을 화폭으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 화폭은 <잠겼다 삐었다 하니 인생의 고락 같소>라고 노래함으로써 고요한 바다에서 동적으로 움직이는 바다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바다의 모습에서 다시 인생을 떠올리고 있다. 결국 바다를 뜻 깊이 사랑하는 이유가 바다는 인생과 같음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다에 대한 관심에서 시인은 「배머리」로 옮겨지고 있다. 바다는 바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하면 언제나 바다를 건너는 배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앞선 시에 나타나는 바다는 고요한 바다였으나, 「배머리」에 나타나는 바다는 <천파에 노도 광풍>이 이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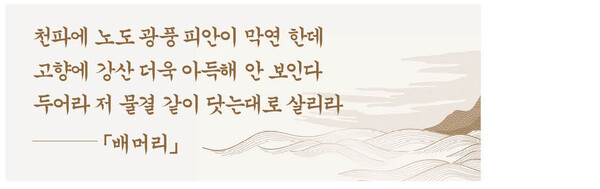
「배머리」에 등장하는 바다는 한 마디로 천파에 노도 광풍이 불어 항해가 힘든 공간이다. 이 힘든 파고를 넘어 항해는 계속되지만, 목적하고 가고 있는 고향 강산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제대로 잡기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아득해 안 보인다>는 시적 서술은 이러한 상황을 엿보게 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시인은 이 상황에 대해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두어라>라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저 물결 같이 닷는대로 살리라>라는 언표는 이를 말한다. 이러한 시적 인식은 앞선 「바다」에서 보여준 바다 자체를 인생의 고락으로 노래한 차원과 같다. 인생살이는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는 날도 있지만 노도광풍을 만나는 시간도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장정심 시인의 이러한 바다와 배에 대한 순수한 일차원적인 인식은 동시로도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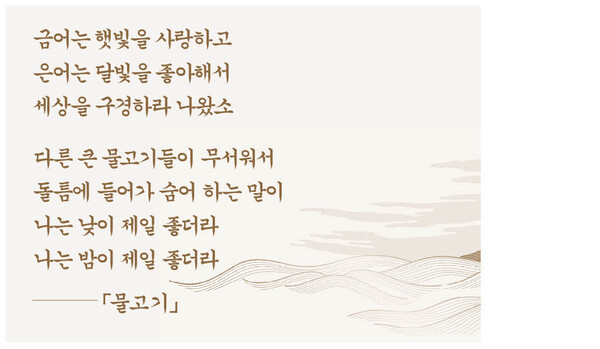
금어와 은어를 등장시켜 햇빛과 달빛을 낮과 밤으로 대비시켜 구조화한 단순하면서도 흥미로운 동시 「물고기」는 동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어려웠던 일제 강점기에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동시를 통해 교육선교를 펼치던 그의 헌신의 한 모습을 이 동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