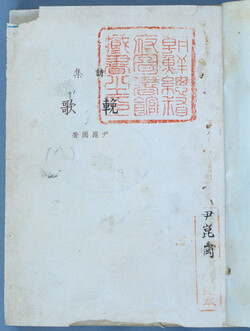
[현대해양] 윤곤강 시인의 본명은 명원(明遠)이다. 충남 서산에서 1911년 8월 24일 출생했다. 일본 젠슈(專修)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카프에도 가담하였고, 동인지 『시학』을 주재하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중앙대 교수, 성균관대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1950년 1월 7일 일찍 세상을 떴다. 남겨진 저술로는 시집으로 『대지(大地』(풍림사.1937), 『만가(輓歌』(동광당서점.1938), 『동물시집(動物詩集)』(한성도서.1939), 『빙화(氷華)』(한성도서.1941), 『피리』(정음사.1948), 『살어리』(시문학사.1948) 등이 있고, 평론집 『시와 진실』(정음사.1948)도 펴냈다. 그의 두 번째 시집 『만가(輓歌』에는 「별바다의 기억」과 「바다로 갑시다」라는 두 편의 시가 실려있다. 먼저 「별바다의 기억」을 읽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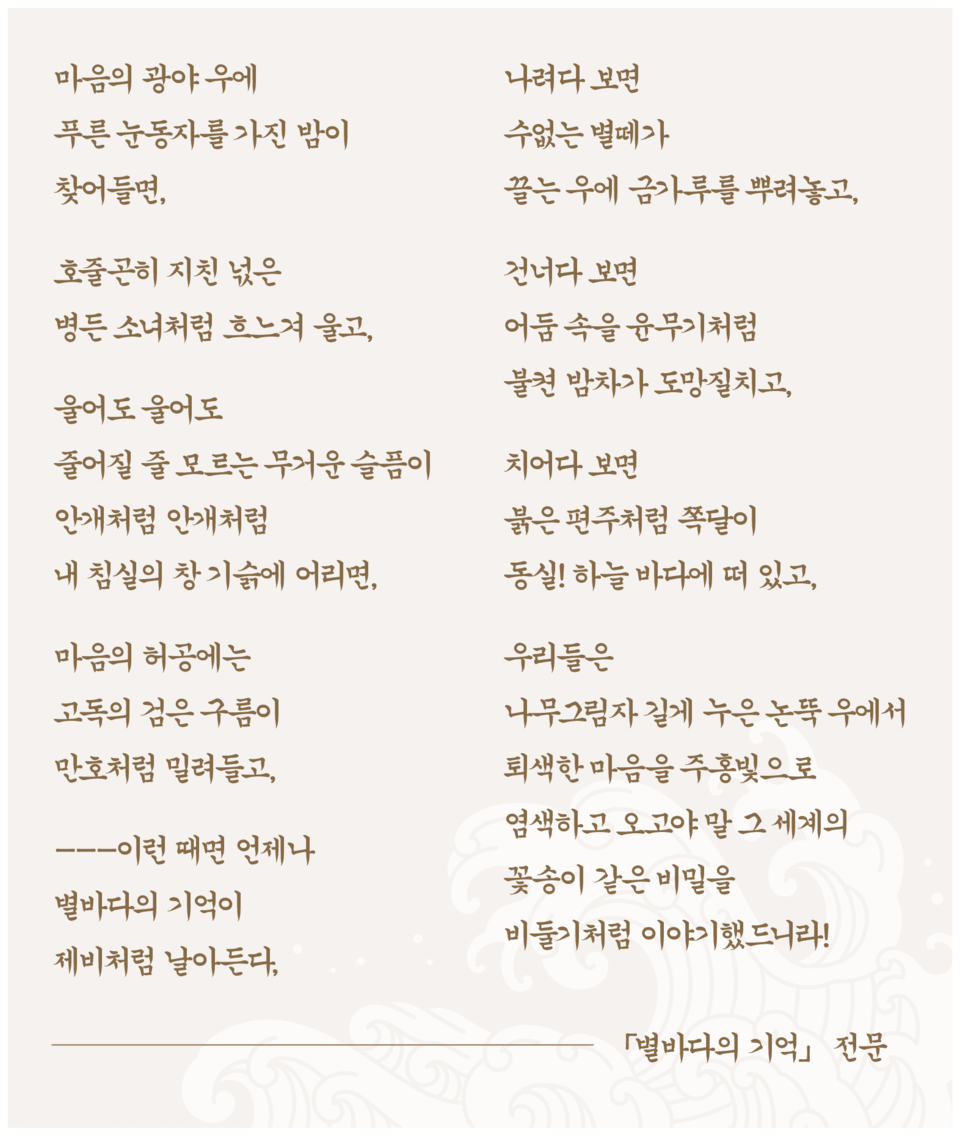
위 시는 현실적인 바다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천상의 별 바다를 노래하고 있다. 시적 자아는 별바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 전에 슬픔을 먼저 토로하고 있다. “울어도 울어도/ 줄어질 줄 모르는 무거운 슬픔”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독의 검은 구름만 만호처럼 밀려들고 있는 지경이다. 즉 무거운 슬픔만을 토로해 보일 뿐이다.
여기서 시적 주체의 슬픔이 직설적으로 내비친다. 이러한 슬픔의 실체는 어디서 온 것인가?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러한 슬픔이나 불안감은 고향 상실을 통한 시대적 절망감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상황에 해당하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슬픔의 인식은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별바다의 기억이 제비처럼 날아들어” 옴으로써 의식의 새로운 전환을 이끌고 있다. 함몰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인 발전으로의 가능성을 피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즉 수없는 별떼가 금가루를 뿌려놓는 상황이 되면 주체의 내면에 어린 슬픔이나 고독은 이를 넘어서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퇴색한 마음을 주홍빛으로 염색하고 오고야 말 그 세계의 꽃송이 같은” 이야기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 시적 자아가 처한 상황은 밤이지만 밤 같은 마음의 슬픔을 씻어낼 하늘의 별 바다를 노래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인 별바다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방이란 갇힌 공간에서 하늘의 별바다인 열린 공간을 지향함으로써 순차적인 변화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것이 하늘 별바다에서 이제 다시 바다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시인은 「바다로 갑시다」라고 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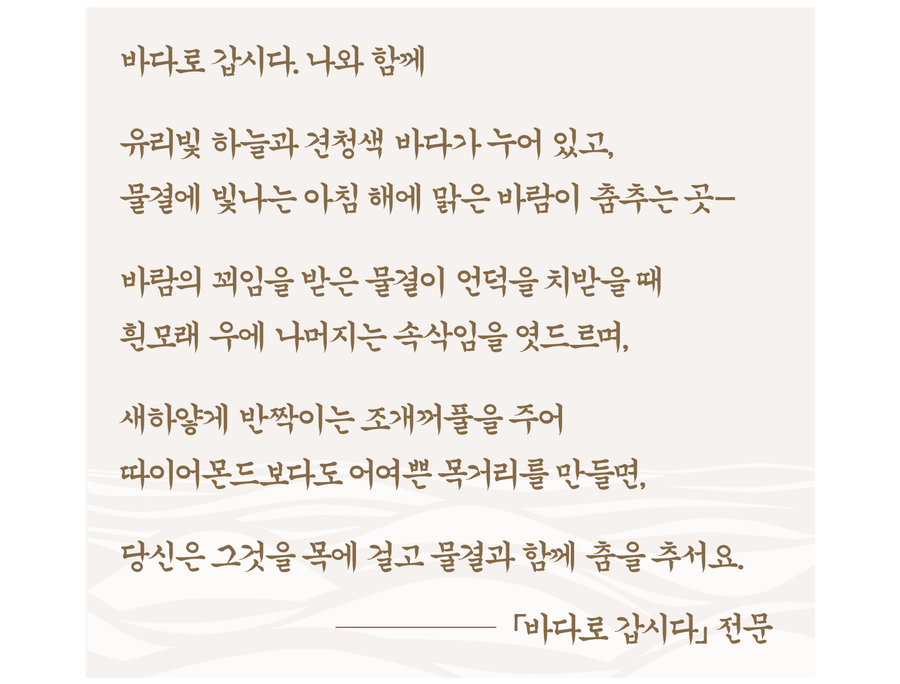
하늘의 별 바다를 노래하던 시인이 이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바다로 갑시다 라고 외친다. 그 바다에는 앞선 시에서 노래하던 울음과 슬픔의 자취가 사라지고 없다. 바다 물결에 빛나는 아침 해가 세상을 밝히고 있는 곳이고 맑은 바람이 춤추는 곳이다. 바닷바람이 불어 물결이 언덕을 치받기는 해도 흰 모래 위에는 속삭임이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반짝이는 조개꺼풀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어여쁜 목걸이를 만들고 이것을 목에 걸고 춤을 추라고 권유한다. 자연스러운 바다의 풍광과 그 바다 공간에서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한 주체를 떠올리게 된다.
시인이 이렇게 밝고 빛나는 시적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어두운 밤 방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일제 강점기의 시공간 속에서 시인은 「별바다의 기억」에서 밤 하늘의 별 바다를 노래함으로써 새롭게 펼쳐질 미래의 세계를 꿈꾸어 보았고, 그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것이 「바다로 갑시다」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윤곤강 시인은 시만 남긴 것이 아니라, 『시와 진실』이란 평론집을 통해 자신의 시론을 펼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장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