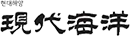[현대해양] 어느 섬이나 귀하고 소중하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아름다움이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도 사람마다 특별한 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섬을 손꼽아 보았다. 신안 우의도, 옹진 장봉도, 여수 추도, 완도 청산도, 통영 연대도, 서산 고파도, 제주 비양도, 울릉군 죽도 등 열 손가락으로 부족하다. 생각해 보니 공통점은 사람이었다. 섬 주민이건, 동행한 사람이건, 사람이었다. 빼어난 자연도 감동을 주지만 사람이 준 공감은 오래가고 늘 그립고 다시 그 섬에 가고 싶게 한다. 고파도가 그런 섬 중에 하나다.
버스는 돌아가고, 배를 기다리는 한적한 어촌
고파도는 충남 서산시 팔봉면에 있는 섬이다. 조선시대에는 서산군 문현면에 속한 고파도리와 태안군 북현면에 속한 고파도리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팔봉면에 속해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도 섬을 동서로 가르는 길을 따라 서산 쪽을 바라보는 곳을 서산 편, 태안 쪽을 바라보는 곳은 태안 편이라 불렀다. 실제로 옛날 노를 저어 오갈 때 뱃길도 그쪽을 향했고, 결혼을 비롯한 생활도 나누어졌다고 한다. 민가는 섬 중앙 동쪽의 갯벌이 발달한 곳에 집중해 있고, 서북쪽 제방을 쌓아 농지와 염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당산을 중심으로 산지가 있다. 마을은 윗말, 아랫말, 끝뿌리말 등 자연마을이 있다.
가로림만은 충청도 내륙으로 들어오는 갯골로 이어져 있다. 육로가 발달하기 전에는 인천을 오가는 배가 가로림만을 가로질러 구도항에 닿았다. 이 배는 태안을 거쳐 대부도를 지나 인천 연안부두로 이어졌다. 고파도 사람들이 인천과 많은 인연을 맺은 이유다. 당시 대부분 학생은 중학교는 서산으로 가더라도 상급학교나 취업을 위해 인천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충남에 속하지만, 오히려 인천과 경기지역과 교류가 활발했다. 지금은 고파도로 가는 뱃길은 구도항에서 출발한다. 하루에 두 번 오가는 여객선과 간간이 들어오는 버스가 잠깐 쉬었다 간다. 한적한 포구다.
고지도나 고문헌에 ‘파지도’ 또는 ‘고파지도’라고 소개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고려때 파지도영을 두었다가 수영을 팔봉면 호리(현 구도 인근)로 옮겨오면서 고파지도가 되었다. 『세조실록』(세조 5년 기묘(1459) 1월 15일)에 ‘파지도 만호의 수영이 바다 가운데 30리에 있으니, 선군이 왕래하는데 어렵습니다. 청컨대 고영으로 옮기소서(兵曹據忠淸道水軍處置使啓本啓: "波知島萬戶營, 在海中三十里, 船軍往來爲難, 請移古營." 從之.)’라는 기록이 있다. 세조도 그대로 따랐다는 내용이다. 병조에서 충청도 수군 처치사가 올린 것을 임금에게 고한 것이다. 처치사는 수군의 으뜸 벼슬이다. 충청·평안도는 각 2명, 경상·전라·함경도에 각 3인이 있었다. ‘고영’은 팔봉면 호리(현 팔봉면 구도 인근)를 말하며, 구도라는 명칭도 이후 수영이 다시 평신진(현 대산읍 화곡리 인근)으로 옮겨지면서 불린 지명이다. 이곳 진은 안흥항에서 경기도 안산 풍도까지 세곡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임무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왜구 방어를 맡기도 했다. 고파도 숲길을 걸어 당집을 지나면 과거 고파도성이 있었다는 성터와 봉화대 터를 만날 수 있다. 아쉽게 주민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무슨 일이 있었지, 가구가 늘었어
고파도 가구 수는 1970년대 50여 세대, 1980년대 40여 세대, 1990년대에 30여 세대로 감소했다. 대부분 섬이 그렇듯 가구가 감소 이유는 먹고사는 문제와 교육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김 양식에서 굴 양식으로, 굴 양식에서 바지락 양식으로 전환할 때마다 10여 세대씩 감소한 셈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자가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했지만, 지금은 전기는 물론 수돗물도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은 여전히 불편하다. 예나 지금이나 식당은 없지만 편의점이 생겼고, 펜션도 몇 집 있다. 그런데 2020년대 고파도는 가구가 70여 세대로 늘었다. 인구는 100여 명에 이른다. 이렇게 가구와 인구가 증가한 시기는 조력발전소가 논의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여느 섬이 그렇듯이 섬 개발은 필연적으로 보상 문제와 연결된다. 그 시기에 가구 수와 인구가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묵정밭에 나무도 심어지기도 한다. 더불어 많은 땅을 외지인들이 매입한다. 그렇다고 외지인들이 섬에 들어와 머무는 것은 아니다. 또 가구 수에 비해 세대 수가 다른 섬에 비해 많은 것도 특징이다. 그 와중에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고 난 후에 고향으로 들어와 여생을 즐기는 사람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조력발전소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가로림만의 조차는 7m에 달한다. 고파도나 우도나 분점도 등 만 안에 있는 섬을 오가는 배의 출항 시간은 물때에 맞춰 앞뒤로 조금씩 바뀐다. 서산시 팔봉면 호리와 태안군 이원면 사창리 사이 가로림만 입구는 약 350m로 지척이다. 서해에서 들어오는 밀물과 좁은 수로를 통해 가로림만으로 유입되었다가 썰물에는 다시 빠져나간다. 지형적 특성상 조류가 아주 빠르게 이동하며 조차도 크다. 이를 점을 이용해 조력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해양생물 서식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 끝에 조력발전소는 백지화되었다.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한껏 조력발전소 건립을 통해 서산과 태안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했던 주민들은 실망했다. 그리고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로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환영했다.

가로림만은 조력발전이 백지화되면서 국가해양정원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가로림만 해양생태환경 복원, 보전과 동시에 활용을 통해 관광거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고파도 역시 국가해양정원에 맞춰 계획이 세워졌다. 이미 다리로 연결된 웅도를 제외하면 가로림만에서 가장 큰 섬이니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갯벌과 모래 그리고 염전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생태교육이나 해양 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하며 관찰하기 좋은 장소다. 그리고 제법 큰 어촌마을이 있어 바지락, 낙지, 굴 등 어촌생활이나 섬살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다.
가로림만 발전 계획이 바뀌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 중, 폐염전을 갯벌로 복원하는 사업이 있었다. 어떤 사업이든 섬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심지어 토지나 양식장 소유자가 외지인일 경우에는 정책을 추진하기 더욱 어렵다. 고파도에는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에 두 개의 염전이 있었다. 모두 폐전되어 소금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였다. 고파도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염전을 통해 해수가 유통될 수 있도록 방조제를 헐어 폐염전을 갯벌로 복원하려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염전 소유주가 정부가 제시한 매입 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강제수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 사업은 강제수용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중단되었다. 그 결과 2022년까지 폐염전을 갯벌로 복원하고, 2030년까지 갯벌어업과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청사진에 그쳤다. 이미 확보한 갯벌 복원과 생태관광 관련 예산은 대부분 반납해야 했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전략이 부재한 결과였다. 독일, 네덜란드, 홍콩, 일본 등 외국에서는 오랜 모니터링과 주민설득 과정을 거쳐 연안습지 재자연화를 진행하고 있다. 갯벌과 연안을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갯벌문화를 고려한 갯벌 복원 당위성이나 지역 기여도 등 기초연구도 부족했다. 그리고 최근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고파도는 개발 바람만 잔뜩 들어찬 채로 멈춰있다.

어느 곳이나 개발계획 이면에는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논의가 주민 갈등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개발이 되던, 보전이 되던 이후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이나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국민의 환경생태지수나 국제사회의 환경보존 요구는 높아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20여 년 전 새만금 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전히 그 고통은 주민들 몫이고, 주민들이 안고 살아야 한다. 그냥 방치한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자연과 문화와 역사 등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개발사업은 그 후유증이 더욱 크다. 정치인이나 개발업자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들이 목적한 것을 챙긴다. 하지만 상처 난 섬과 주민들은 아픔이 옹이가 되어 굳은살이 생길 때까지 견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