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양] 정지용은 1902년 6월 20일 충청북도 옥천군 읍내면 향청리에서 태어났다. 옥천공립보통학교와 휘문고등보통학교, 도시샤대학 영문과를 졸업했다. 1926년 『학조』 창간호에 「카페·프란스」를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정지용의 첫 번째 시집은 『정지용시집』으로 1935년 시문학사에서 초판 발행되었다. 전체 5부로 나누어 87편의 시와 2편의 산문을 수록하고 있다. 시집을 편집한 박용철이 말미에 있는 「발(跋)」에서 5부로 구성한 이유를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목차는 앞쪽이 아닌 시집 말미에 2면 가로쓰기로 실려 있다. 제1부는 「바다1」, 「바다2」, 「비로봉」, 「유리창1」, 「유리창2」 등 정지용이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후 쓴 16편, 제2부는 「압천」, 「석류」, 「향수」, 「발열」, 「카페 · 프란스」, 「호수」, 「말1」 등 초기 시편들 39편, 제3부는 「해바라기씨」, 「지는 해」, 「산 넘어 저쪽」, 「홍시」, 「종달새」 등 동요·동시류와 민요풍 시편들 23편, 4부는 「불사조」, 「나무」, 「은혜」, 「별」, 「갈릴리아」, 「바다」 등 신앙과 직접 관련 있는 시편들 9편, 제5부는 「밤」, 「램프」 등 산문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바다시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만큼 일본 유학시기 바다 연작시 및 바다를 소재로 많은 시편을 남겼다. 정지용은 조국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을 때 처음으로 바다를 경험했다. 그리고 유학시절 일본과 조선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체험한 항해에서 바다에 대한 남다른 이미지로 시를 남겼다. 여러 바다 시편 중 「갑판(甲板) 우」, 「해협(海峽)」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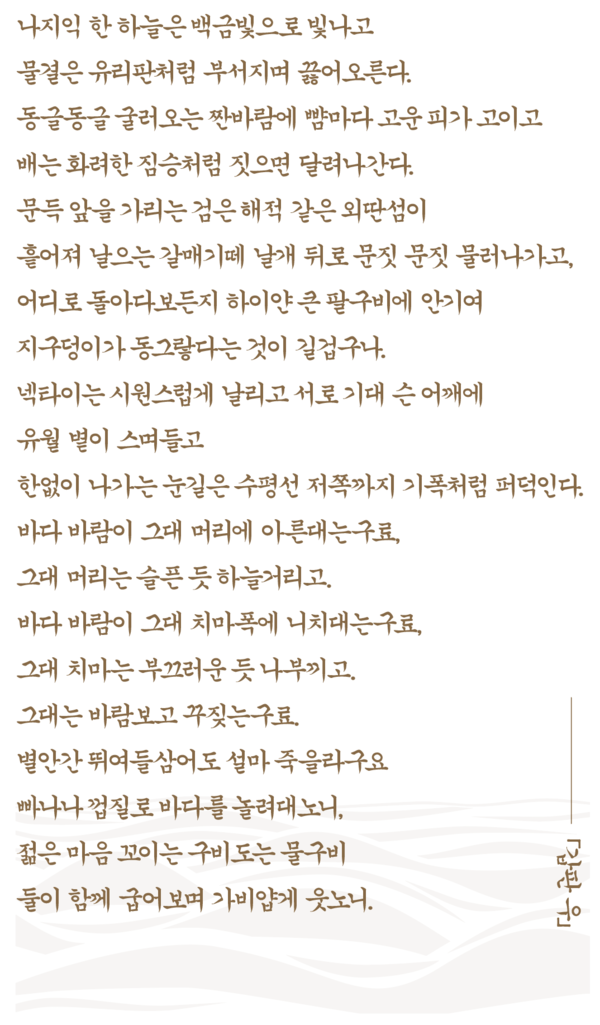
「갑판 우」는 1927년 《문예시대》 1호에 발표한 정지용 시인이 바다를 소재로 한 첫 작품이다. 시 속에는 바다, 외딴 섬 등과 같은 자연경관이 보이고 배, 넥타이, 치마 등 시적 대상이 등장하고 그대와 시적 화자 두 사람이 갑판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시인은 대낮의 거센 바다를 직유법으로 동적인 상태를 이미지화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바람을 머리, 치마의 휘날림으로 의인화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바람을 꾸짖고 바나나 껍질로 바다를 놀려대고 있다. 이렇게 이 시는 바다의 자연공간과 갑판 위의 공간을 이미지화하고 있다. 같은 시간 속에서의 두 공간을 노래하고 있지만, 바닷바람이 두 공간을 하나의 시적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매개가 되고 있다. 다음 「海峽」을 읽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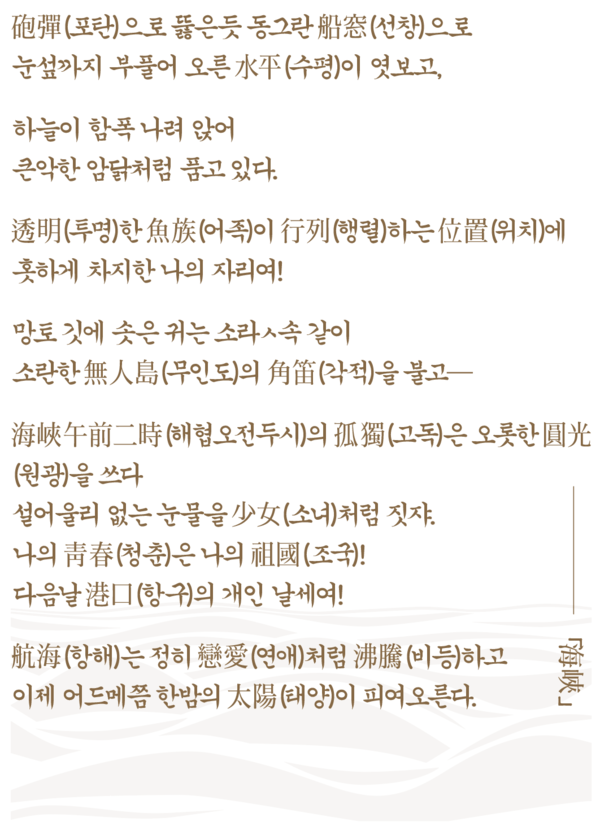
「해협」은 정지용 시집에 「해협」으로 실려 있지만 가톨릭청년 1호(1933.6)에 처음 발표될 당시에는 「海峽의 午前 二時」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었다. 오전 2시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시적 화자를 생각한다면, 이 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일본 유학을 갔던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짧게는 8시간에서 길게는 11시간이 넘는 시간을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면서 많은 이들이 잠들었을 새벽 두 시에 홀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 시의 분위기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선실에서 조그맣게 난 동그란 선창으로 내다본 바다를 “눈섶까지 부풀어 오른 水平이 엿보”는 풍경으로 그려내고 있다. 또한 “하늘이 함폭 나려 앉어/큰악한 암탉처럼 품고 있다”고 배에서 바라본 바다의 풍경을 이미지화하고 있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동안 내내 들려오는 바닷물을 가르는 소리, 갈매기 소리, 배의 기적 소리는 “소란한 無人島의 角笛을” 부는 소리로 청각화하고 있다. 그리고 “설어울리 없는 눈물을 少女처럼 짓쟈”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청년 시인의 고독과 비애가 묻어난다. 그래서 “나의 靑春은 나의 祖國!”임을 시인은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벽 2시에 잠 못 이루며 홀로 깨어 있는 이유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다. 바로 다음 행에 “다음날 港口의 개인 날세여!”라고 노래하는 것은 “나의 청춘”과 “나의 조국”의 내일에도 ‘개인 날씨’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시인의 소망이 담겨있다. 항해는 “戀愛처럼 沸騰”하지만 식민지 조선의 청년에게는 잃어버린 조국의 현실이 가로놓여 있었던 것이다.-web-resources/image/2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