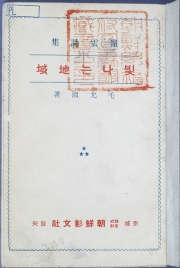
[현대해양] 모윤숙 시인은 첫 시집 『빛나는 지역』(1933)을 펴내고, 일제 치하에서 민족적인 진로를 모색하는 의미와 정열적인 삶을 추구하는 시인의 지향이 엿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1937년 출간된 그녀의 산문집 『렌의 애가』는 1978년까지 53판이 출간될 정도로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판매된 책이었다.
그래서 1969년 김기영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 시기 각종 친일 단체에 가입하여 학병 지원 관련 강연과 저술로 친일 행각을 활발하게 펼쳤다.
이러한 굴곡의 삶을 살아온 모윤숙 시인은 초기 시에서 바다를 어떻게 노래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뱃전에서」를 읽어보자.
나의 배앞엔 등대도 없어
물살센 밤바다에 방향도 없구나
시컴언 물결은 끗단대도 없고
바람쫓아 내 피를 다- 빨아가는가.
포구도 없고 안식도 오지 안을
영원한 쫓김에 이 배는 밀려가
한번의 폭풍으로 깨일듯도 갓고
한번의 빗발로 까라안기도 하려니.
사공도 없는 널 조각배에/어이한 운명의 손길을 따라
무서운 바다의 물소리 파동치는데
외로운 바다길을 홀로 가는고.
- 1928년 여름 원산 바다에서 「뱃전에서」
시 「뱃전에서」 내보이는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다. 1연에서 보여주는 「뱃전에서」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배 앞에는 등대도 없고 거기에다 물살 센 밤바다이기에 방향도 잡기 힘들다. 또한 바람조차 불어 시커먼 물결은 끝 간 데도 없이 치고 있다. 2연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배가 정착할 수 있는 포구도 보이지 않고, 안식도 할 수 없어 계속 밀려만 가는 신세이다. 나아가 한 번의 폭풍으로 배가 파산될 수도 있고, 한 번의 빗발로 가라앉을 수도 있는 지경임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3연에서 드러나는 배의 환경조건은 더 심각한 상태임을 알려준다. 시적 화자가 탄 배는 사공도 없는 널 조각 배이다. 이렇게 무섭게 파동 치는 바다 속을 홀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시적 상황은 모윤숙 시인의 개인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시가 창작된 연도가 1928년 여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1910년 생인 모윤숙으로 보면 18세 나이에 쓴 시이다. 그가 1925년에 함흥 영생보통학교를 졸업했고, 1927년에는 개성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 예과에 입학했다. 그러므로 1928년은 이화여자전문학교 시절이다. 이 때 자신의 현실적 삶이 「뱃전에서」 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바다를 통해 절망적인 상황을 내보였던 시인은 「바닷가에서」에서는 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다.
오 나의 영혼의 고향
영원히 젊어 있는 바다의 품이여
푸른 미소의 휘감긴 그리운 이 꿈을
차라리 새벽없는 어둠 속에 잠들게 하여라.
갈릴리 성자의 의로운 옷깃은 바다 위를 날넛거니
괴로운 실수에서 상처난 이 발길은 무겁기 한이 없어라
차라리 무궁한 해변에 제단을 쌓고
머얼리 뵈는 항구에 향불이나 피어보리.
나의 혼을 나의 젊음을 다- 가저다가
바다 저편 그 언덕에 대일 수 있다면
슬픈 항구에서 눈물진 자욱자욱은
그 푸른 물결이 고이도 씻어주리.
어이 한 종소래 구름밖에 떠러저
파도의 줄을 타고 내 맘을 흔드노나
오- 그 크나큰 호흡 속에 나를 안어서
이 적은 생명을 산산히 부서달나.
- 1933년 8월 「바닷가에서」
시인은 우선 바닷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입장에 서서 바다를 인식하고 있다. 바다가 시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비추고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 있다. 1연에서 이해하고 있는 바다는 나의 영혼의 고향이다. 시인이 말하는 영혼의 고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다음 행의 시구와 연관 지어 시 문맥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영원히 젊어 있는 바다의 품이여>라고 노래함으로써 바다는 영원히 젊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영원히 젊어 있는 바다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선은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바다임을 상기시킨다. 바다도 분명 시절과 기후 변화에 따라 쉼 없이 변하기 마련이지만, 영원히 젊어 있다는 것은 살아 있음의 생명력을 언제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생명력은 바로 영혼의 고향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고향은 자신의 생명의 터전이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어디서 일생을 살아가든 자신의 생명의 탯줄인 고향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육신의 고향을 넘어 영혼의 고향으로 승화될 때, 그 고향의 의미는 영원히 젊어 있는 바다처럼 영원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 바다의 품에 <푸른 미소의 휘감긴 그리운 이 꿈을> 잠들게 하여라고 기원하고 있다.
2연으로 오면 시적 대상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던 성자 예수로 전환된다. 그는 의로운 옷깃으로 바다 위를 가볍게 걸었지만, 시인은 괴로운 실수로 상처 난 이 발길이 무겁기만 하다고 토로한다. 그래서 무궁한 해변에 제단을 쌓고 멀리 바라보이는 항구에 향불이나 피어볼 생각을 한다. 이는 바닷가에서 바다 저편 언덕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의(祭儀)에 가깝다. 3연에서 나의 혼과 젊음을 다하여 바다 저편 그 언덕에 대일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슬픈 항구에서 눈물을 푸른 물결이 씻어주기를 기원하고 있다. 상처 나고 속된 나를 새롭게 정화시켜 가려는 소망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영혼에 대한 정화의식은 3연에서는 절정을 이룬다. 3연에서 구름 밖에 떨어지는 한 종소리는 어쩌면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늘의 소리일 수도 있다. 그 소리를 바다의 파도 소리 속에서 듣고 있다. 그 파도 소리 속의 소리가 시인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시인은 그 크나큰 호흡 속에 나를 안아서 이 적은 생명을 산산이 부수어 달라고 요청한다. 일상의 삶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새로운 큰 생명으로 거듭나려면 현재의 작은 생명은 산산이 부셔져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시인은 바닷가에서 자신의 생명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시인이 이 시의 첫 구절에서 <오 나의 영혼의 고향>이라고 바다를 명명한 까닭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바다가 2연에서는 갈릴리 성자가 걸었던 바다로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간의 생명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던 예수가 걸었던 바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바다를 통해 종교적인 사유를 개입시킴으로써 자기 정화를 통해 자신의 삶의 지향점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젊은 시절 시로 보여주었던 이런 자기 성찰이 일제 강점기에 친일과 야합이라는 욕된 개인사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삶의 노정이 안타깝다.p48-web-resources/image/13.png)

